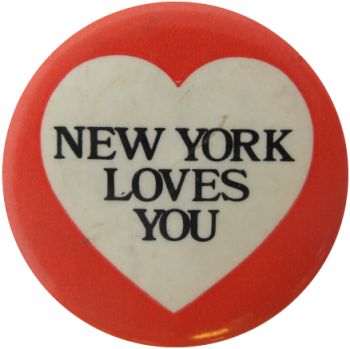2024. 7. 23. 15:35ㆍBook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네 안에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들어 있고, 너는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서보다 삶을 버티는 힘을 기르기 위한 독서가 조금 더 의미 있지 않나?
'책과의 독대라는 자폐적인 행위'를 꾸준히 지속하다 보면 어떤 굳건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최소한의 무엇인가가 지켜지는. 책과 밀착해서 내면으로 침잠하는 행위가 스스로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모처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를 떄에는 내 직업적인 일과 관련이 없는 무엇인가를 읽는 게 정신적으로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문학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것, 이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데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책을 읽으면 '내 안의 세계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의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세계가 내 안에 하나 구축되는 거잖아요. 어떤 다른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세계가 우리 안에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으면, 외부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이 밀려오더라도 내 안의 구축된 세계만으로 행복함이나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데미안을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살던 우리가 자신에 대해 깨닫고,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주체적인 모습을 가지는 부분을 높이 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데미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자아와 세상에 대한 각성'이 것 같아요. 세상의 풍파에 치이면서 선도, 악도 알아가는 경험을 하니까요.
사실 문학은 정답이 없고, 자신이 어떤 순간 또는 시기에 읽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다르게 읽히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호전적이거나 내면적으로 들끓는 느낌이 아니라 묵묵한 느낌으로, 주어진 생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 찾아 나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가톨릭에서는 어둠이나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바라봐요. 헤르만 헤세는 자신에게 주입되었던 가톨릭적인 진리와 세계관을 비롯한 모든 고리타분한 것들과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싸워나간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했어요. 알을 깨고자 했던 것도 저는 가톨릭 의미에서 말하는 계명을 깨고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로 읽었어요. 마지막에 싱클레어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했던 것도, 가톨릭에서 말하는 진리와 더 이상 싸워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헤르만 헤세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내재화된 것 같았어요.
'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라본 후에 다스리는 마음> 2 (3) | 2024.07.24 |
|---|---|
| <바라본 후에 다스리는 마음> 1 (4) | 2024.07.24 |
| <가장 사적인 관계를 위한 다정한 철학책> 3 (3) | 2024.07.23 |
|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 1, 2, 3 (0) | 2024.05.30 |
| 언제 행복할 것인가 - 5 (0) | 202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