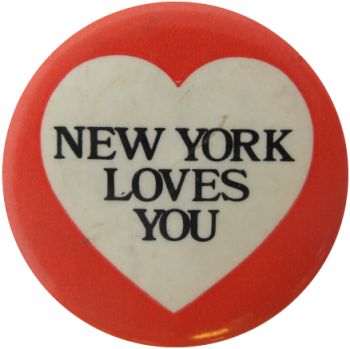2024. 1. 11. 19:05ㆍBook
'구성'이란 무엇인가?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것은 환자의 병력에 관한 과거의 경험과 사건, 특히 환자 자신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증상 발현의 '옛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이다.
즉, 환자가 소파에 누워 '자유연상'을 통해 제공하는 소재를 실마리로, 본인이 이미 증언할 수 없게 된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를 "파괴되고 파묻힌 주거지나 과거의 건축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의 작업과 아주 닮았다"고 부연한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작업은 어디까지나 회고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혹시 이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설일 뿐이다.
애초에 무의식이란 한 개인의 내면에서 기억이 쌓이면서 말들어지며, 신경증의 증상도 결국 무의식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그 자신으로 만드는 개인의 역사, 즉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고려해야만 그 사람의 증상도 이해할 수 있다.
무의식은 그 이름대로 환자의 의식에서 떨어져 있다.
그뿐이랴, 우리속에는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을 가능한 한 멀리 몰아내려는 역학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그것을 '억압'이라 불렀다.
즉, 무의식에 모여 있는 것은 의식의 바깥으로 밀려나고 꽉 눌려 있는 기억이다.
정신분석은 환자 자신이 조금이라도 억압을 뛰어넘어 무의식과 만나고 그곳에 감춰진 환자 자신의 역사=이야기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지향한다.
환자는 증상의 배경에 있는 역사=이야기를 그 자신의 말로 지금 다시 말해야 한다.
분석가의 본질적인 역할은 그를 위한 촉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분석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분석의 '결과'이며, 증상을 계기로 하여 환자가 '왜 나는 이렇게 된 것일까'를 자문하고 그 때까지의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정신분석의 과정은 억압과의 싸움이며, '구성'은 그 싸움의 이정표다.
프로이트는 구성된 내용이 환자의 과거 경험이나 사건을 바르게 맞힌다면 환자가 억압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다고 생각했다.
기억은 마음 속 깊은 곳에, 즉 무의식 속에 분명히 잠재되어 있다.
환자가 이를 떠올리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억압의 힘이다.
또는 기억을 억압함으로써 지금의 스스로를 만들어 낸 환자 자신이다.
구성의 목표는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 환자 자신이 기억을 떠올릴 실마리를 만드는 것이다.
환자가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무언가를 잊고 있는데, 그의 무의식은 그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
잃어버린 것은 무의식을 통해 환자 자신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는다.
출처: <라캉과 철학자들>